김현·조화순 연구팀은 2025년 발표한 연구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한국 사회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형식적 자유’, ‘실질적 자유’, ‘자율성으로서의 자유’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공공 감시, 산업 자동화, 개인 결정 지원이라는 세 분야를 중심으로, AI가 어떻게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확장하는지를 다각도로 고찰했다.
AI는 어느덧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했다. CCTV가 자동으로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은행 창구는 AI 뱅커가 대신 응대하며,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술이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자유를 형식적 자유, 실질적 자유, 자율성으로서의 자유라는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형식적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자유다. 이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 즉 프라이버시와 직결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AI 기반 CCTV와 예측 기술을 치안과 교통 관리에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한강공원을 포함한 서울 전역에 AI CCTV 1,8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실시간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기술은 시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도입되지만, 개인의 일상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라는 형식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다.
두 번째 자유는 실질적 자유다. 이는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 특히 고용 기회나 교육 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산업 전반에서 AI가 확산되면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의 51%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7%는 ‘높은 노출도, 낮은 보완도’ 집단으로, 기존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연구는 실질적 자유 침해가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 자유의 박탈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자리를 잃거나 새 일자리에 진입할 역량이 부족할 경우, 개인은 선택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AI 시대에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전환 능력 함양과 소득 보장 방안까지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번째 자유는 자율성으로서의 자유다. 이는 개인이 감정, 충동, 외부 유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개인의 소비 결정, 미디어 정보 선택, 정치 판단까지 AI가 개입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과거 행동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안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선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은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유사한 콘텐츠만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에코 챔버 현상을 강화하고, 정치 영역에서는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나 조작된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정치가 아직 이런 위협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AI가 선거 전략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금,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자율성 침해의 핵심 원인은 AI 설계의 목적에 있다. 플랫폼은 수익 극대화를, 정치인은 유권자 조작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성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AI는 정보를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판단 구조 자체를 형성하는 권력 기제로 기능하게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단순히 AI를 규제하거나 기술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누구를 위한 설계인가'를 지속적으로 묻는 태도와, 개인의 권리를 넘어 공동체 기반의 연대와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 설계라고 강조한다.
AI는 자유를 확장할 수도, 억압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기술이다. 이 연구는 그 가능성의 양쪽을 모두 열어두고, 그 미래는 기술이 아닌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공공 감시 기술은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면서도 안전을 명분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 자동화는 직업의 실질적 자유를 약화시킨다. 개인 의사결정 지원 기술은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설계와 운영이 기업과 정치 집단의 이해에 기초할 경우 오히려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 정책은 단순히 기술의 위험을 막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중심 가치로 놓고 기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정착과, AI가 공동체 신뢰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가 AI 시대에 어떤 자유를 지키고, 어떤 자유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지를 묻는 출발점이다. 이제 국회와 시민사회, 기업과 기술자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논문: Forthcoming
유튜브:
https://youtu.be/yxRPybRekcI
AI가 만드는 자유의 역설, 우리는 더 자유로워졌는가
엄기홍 기자
|
2025.09.11
|
조회 306
공공 감시부터 산업 자동화, 소비 유도까지…AI 시대 한국 사회의 세 가지 자유를 재조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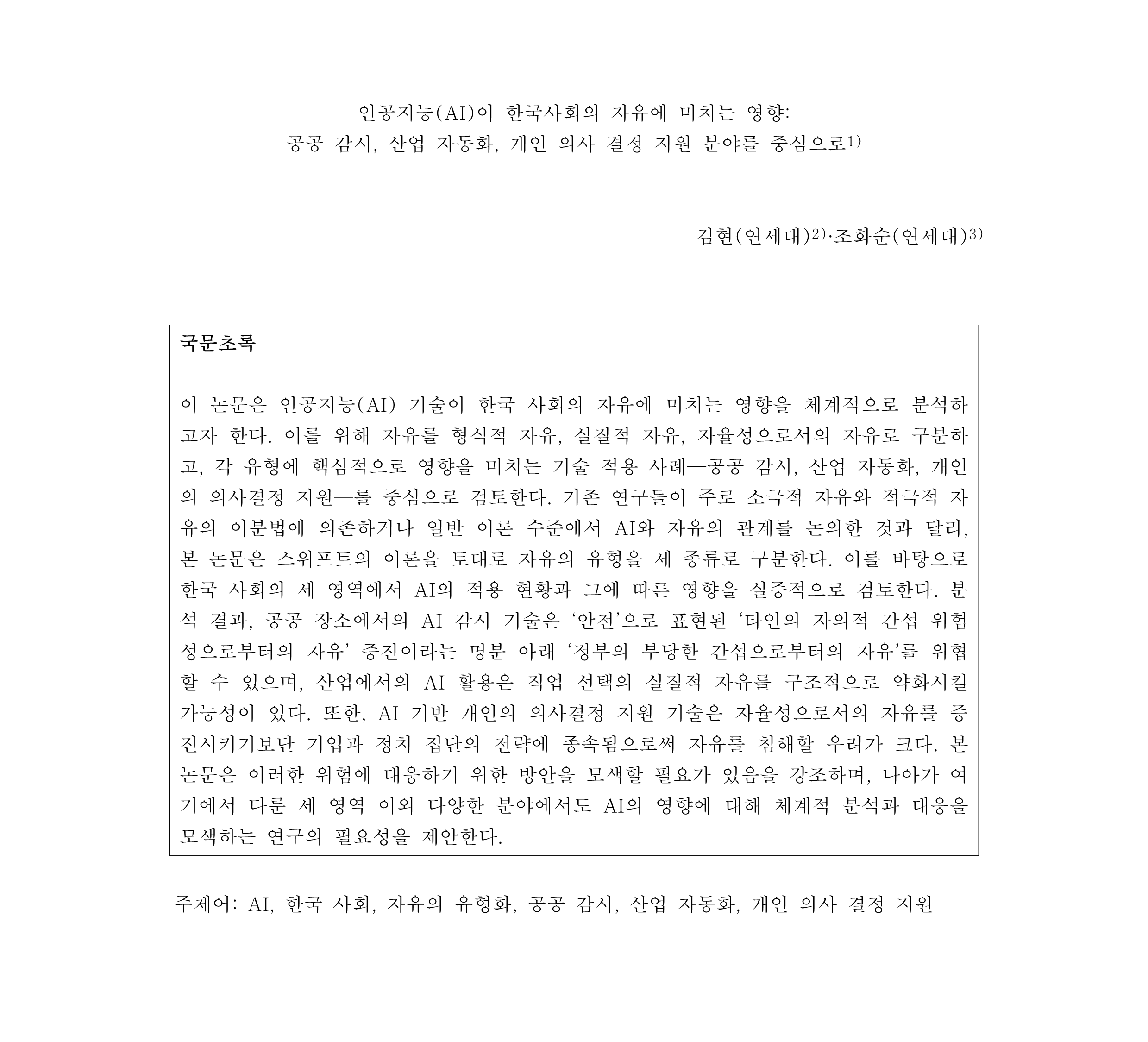
출처: 한국정치연구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