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태국과 방글라데시는 미얀마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하고 있다. 두 국가는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난민정책을 유지해왔다. 태국은 제한적 수용, 방글라데시는 통제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 이 연구는 그 차이를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원칙이 아닌, 각국의 정치 체제, 국경 지역의 정치적 맥락,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난민협약 미가입국인 태국과 방글라데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난민 정책을 구성했는지를 분석한다. 두 국가는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카렌족(태국)과 로힝야족(방글라데시)을 다수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은 난민을 ‘피해자’로, 방글라데시는 ‘위협’으로 인식하며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택하고 있다.
태국은 난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NGO와 협력해 제한적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한다. 2019년 도입된 국가심사제도(NSM)는 ‘보호 대상자’라는 별도 범주를 설정해 미등록 난민을 관리하며, 제3국 재정착을 통한 외부화 전략도 병행한다. 캠프 내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자립 기반도 일부 허용되지만, 이는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 이처럼 태국은 ‘제도 밖 보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면서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콕스바자르 지역에 100만 명 이상을 수용하며 이동과 노동은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는 바산차르라는 외딴 섬으로 강제 이주되기도 했다. 로힝야는 ‘미등록 미얀마 국적자’로 분류되어 공식적인 난민 지위도 부여되지 않으며, 귀환을 전제로 한 임시 보호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무마하면서도 난민의 사회통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 연구는 양국의 상이한 난민정책이 단순한 국제 규범 수용 여부나 경제 여건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국내정치의 구체적인 맥락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음을 강조한다. 태국의 경우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국경 지역의 ‘정치적 비가시성’이 탈정치화된 난민 수용을 가능케 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에서 로힝야 난민 문제를 국가안보 이슈로 재구성하며 통제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왔다.
또한, 사회적 인식 프레임에서도 두 국가는 대조적이다. 태국은 카렌족을 ‘피해자’로, 방글라데시는 로힝야를 ‘범죄자’나 ‘위협 집단’으로 규정했다. 태국 내에서는 종교적 차이를 포함한 문화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동정과 지원이 가능했다. 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로힝야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 프레임이 널리 퍼져 있어, 이들을 ‘영구적 외부자’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정부의 통제 전략과도 맞물려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 체제’, ‘지역의 정치적 가시성’,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세 가지 국내정치 요인을 분석틀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제규범에 기반한 제도적 분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제도 밖 난민정치’의 실체를 조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태국과 방글라데시 사례를 통해 국제 난민 레짐 외부에서도 다양한 난민 정책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각국의 국내 정치 체제와 권력 구조, 사회적 인식이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집행 방식에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 보호를 촉구하려면, 각국의 국내정치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면밀히 이해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나아가, 장기적인 난민 정책은 난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정치적 행위 주체로 인식하고, 사회적 통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 https://doi.org/10.21051/PS.2025.08.33.2.129
유튜브:
https://youtu.be/8KCW6Q0_4xw
태국과 방글라데시, 난민정책 왜 달랐나
엄기홍 기자
|
2025.09.18
|
조회 392
난민레짐 바깥에서 드러난 두 국가의 전략적 난민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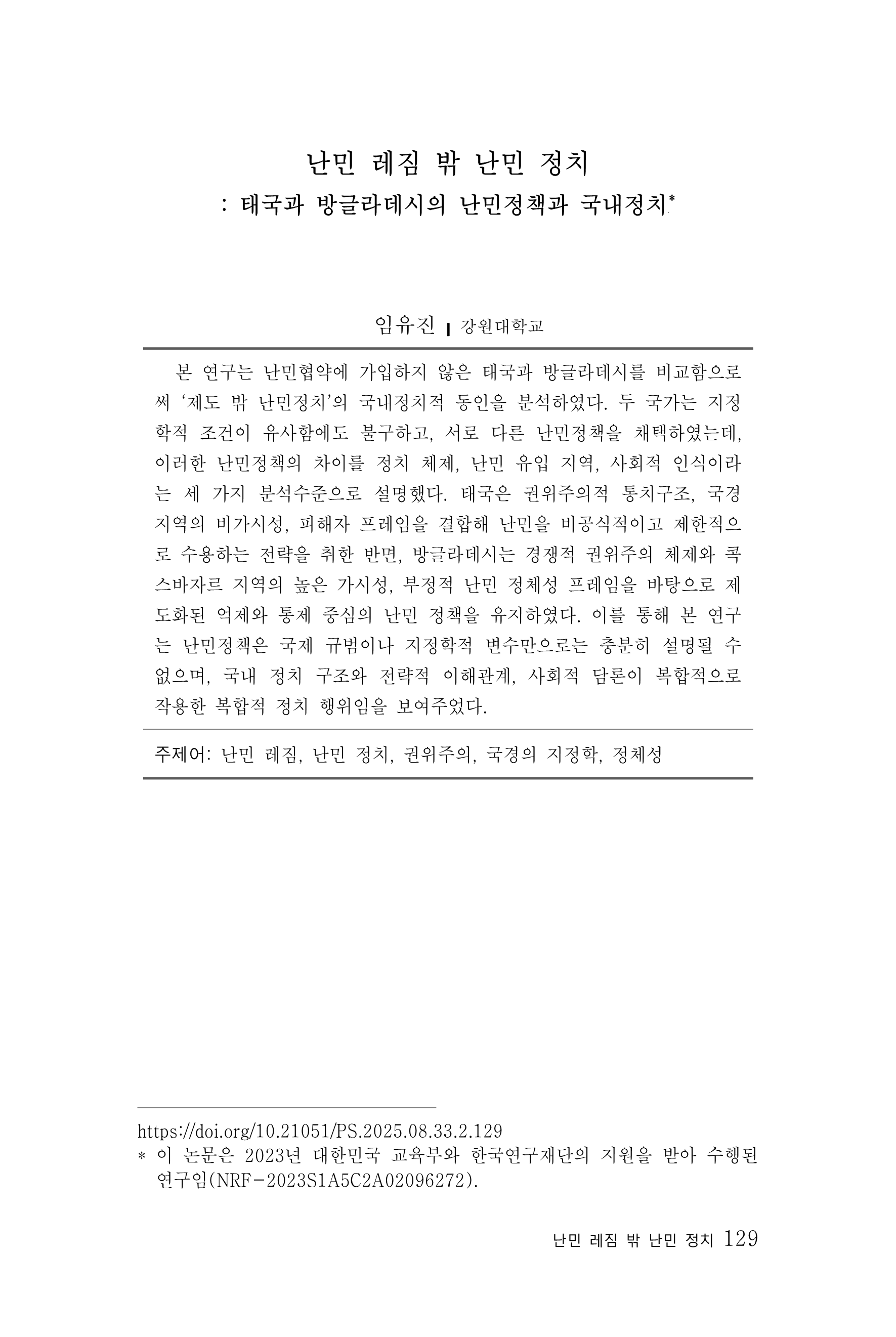
출처: 평화연구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