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수백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 시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되고 확산되었다. 본 기사에서는 SNS가 촛불집회의 동원과 확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 정치 참여가 실제로 참여민주주의를 증진시켰는지 분석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는 ‘디지털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SNS를 통해 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집회 참여를 조직한 이 과정은 전통적인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조직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규모 정치 행동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당시 참가자 중 상당수는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친구나 가족 단위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해시태그 운동, 패러디 깃발, 실시간 위치 공유 맵, 그리고 ‘박근핵닷컴’과 같은 자발적 온라인 플랫폼은 개개인의 정치적 감정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운동의 규모를 확대했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이론과 ‘집합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이론을 통해 설명되며, SNS가 정치운동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SNS가 집회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시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졌는가? 저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민들은 정보 공유와 의견 표출에는 활발히 참여했지만, 실제 정치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도시계획가 셰리 아른스타인의 ‘참여의 사다리’ 개념에 기반해 분석된다. 그녀는 참여를 무참여, 형식적 참여(토큰주의), 시민 권력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었으며,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은 마지막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저항 권력을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그 권력이 제도권 정치에 흡수되거나 지속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결국 탄핵 이후에도 국정은 기존의 엘리트 정치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시민들은 여전히 '통치의 대상'으로 머물렀다. SNS는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는 지속적인 정치 구조의 전환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디지털 기술은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SNS를 통한 정치 참여가 ‘시민 권력’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도 정치의 적극적인 수용과 개방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이 디지털 시대의 시민들을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닌 협력적 통치 파트너로 인식하고, 참여 구조를 제도화할 때 비로소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https://doi.org/10.1080/01436597.2020.1806708
유튜브: https://youtu.be/nzuKTZdNeiw
촛불로 이룬 정권 교체, 민주주의의 승리였나
엄기홍 기자
|
2025.05.15
|
조회 130
SNS가 주도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시민참여 확대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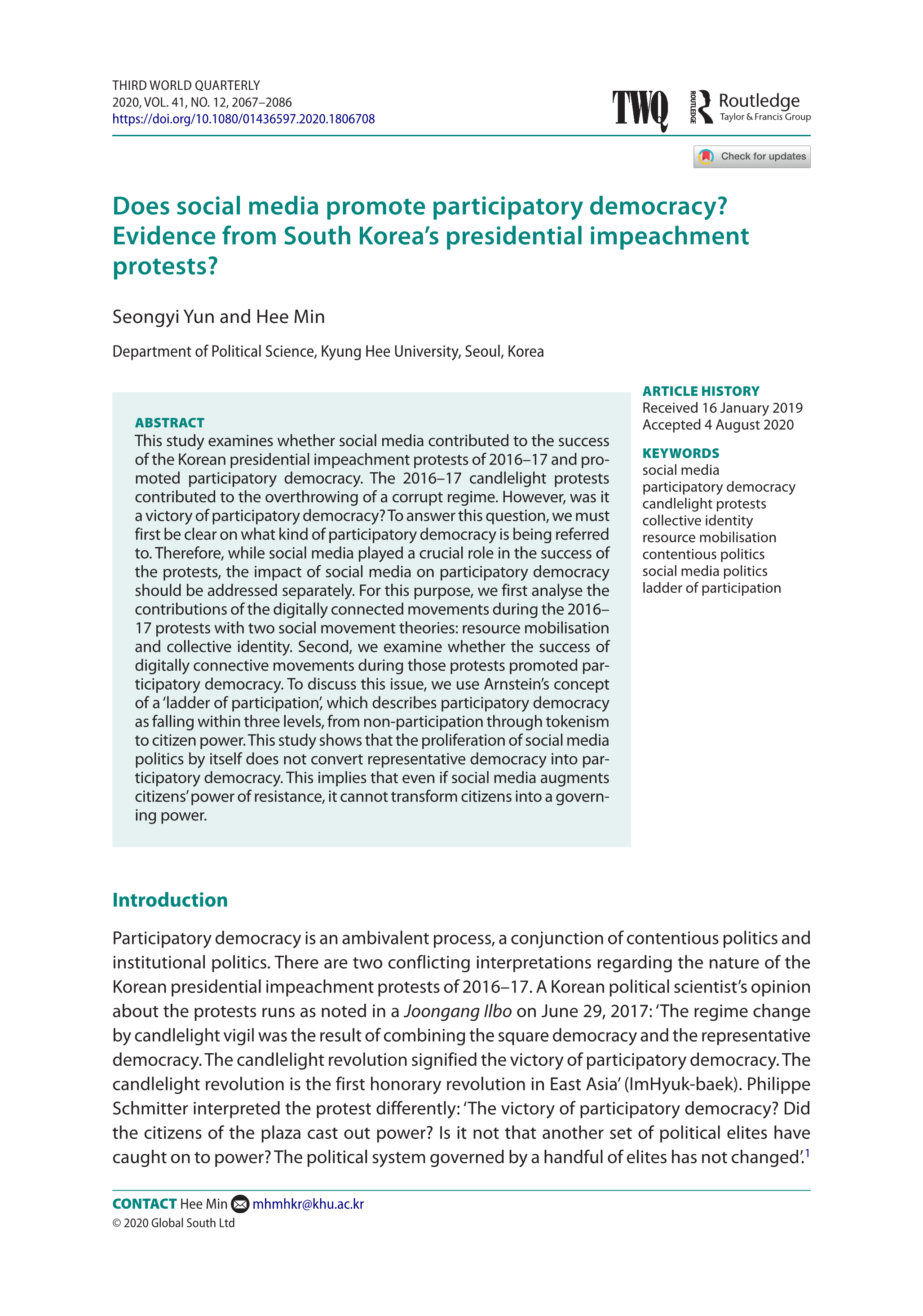
출처: Third World Quarterly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