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부산과 인천 주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가을 진행된 설문조사가 정부신뢰의 결정 요인을 드러냈다. 연구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를 구분해 분석했고,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 언론의 영향, 지방의회의 신뢰 등이 정부신뢰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간 지속된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한계가 고스란히 비친다.
한국에서 정부신뢰는 단순한 사회적 정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운영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다. 권위주의 시절에도 체제 안정을 위해 정부신뢰가 필요했듯, 민주주의 체제에선 시민의 신뢰가 곧 제도 정당성과 직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신뢰만 분석했을 뿐, 지방정부 신뢰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과 인천을 대상으로 양자를 분리해 살폈다.
분석 배경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제도화 과정이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효용성은 논쟁 대상이다.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지방정치가 정실주의와 이권 독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는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산 2,500명, 인천 1,935명을 표본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다. 놀랍게도 평균값에서 중앙정부 신뢰(2.68점)가 지방정부 신뢰(2.53점)를 소폭 앞섰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중앙·지방 모두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강도는 중앙정부 신뢰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대통령제의 ‘제왕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언론에 대한 신뢰는 지방정부 신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특히 부산에서는 지역 언론 신뢰가 지방정부 평가와 밀접히 연결됐다. 이는 중앙정치 중심의 언론 보도가 중앙정부 신뢰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지방 이슈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정치이념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중앙정부 신뢰는 이념 성향과 약한 상관성을 보였지만, 지방정부 신뢰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없었다. 다만 제약모형을 적용했을 때는 진보 성향일수록 중앙정부를, 보수 성향일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넷째,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지방정부 신뢰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이는 여타 제도보다도 지방의회가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 신뢰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방자치 30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는 지방의회가 실제로는 지방정부 신뢰 형성의 핵심이라는 역설적 결과다.
또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가 높을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상승했다. 흥미롭게도 이 효과는 중앙정부 신뢰보다 지방정부 신뢰에서 두 배 가까이 크게 나타났다.
결국 정부신뢰의 결정 요인은 중앙·지방 차원에서 동일하지 않았다. 대통령 신뢰는 두 층위에 공통적으로 작용했지만, 언론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국한된 변수로 기능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독자적 정치동학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지방정치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가 단순히 동조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5년 조사에서는 중앙·지방 신뢰가 분리되는 ‘탈동조화’ 현상이 관찰됐지만, 2019년 부산과 인천에서는 오히려 중앙정부 신뢰가 지방정부 신뢰를 앞서는 역전이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등 중앙정치의 격변이 지방정치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지방민주주의가 성장하려면 중앙정치의 소용돌이가 잦아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제고, 지역 언론의 건전한 역할,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동시에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독립된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결국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는 중앙정치의 안정성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향후 지방분권 관련 입법과정에서도 핵심 논점이 될 것이다.
논문: https://doi.org/10.29274/ews.2021.33.4.153
유튜브:
https://youtu.be/JlDgg5jFM78
중앙-지방 간 정부신뢰의 엇갈린 흐름, 부산과 인천이 보여준 현실
엄기홍 기자
|
2025.08.18
|
조회 115
대통령 신뢰, 언론의 역할, 지방의회 영향력이 엮어낸 정부신뢰의 새로운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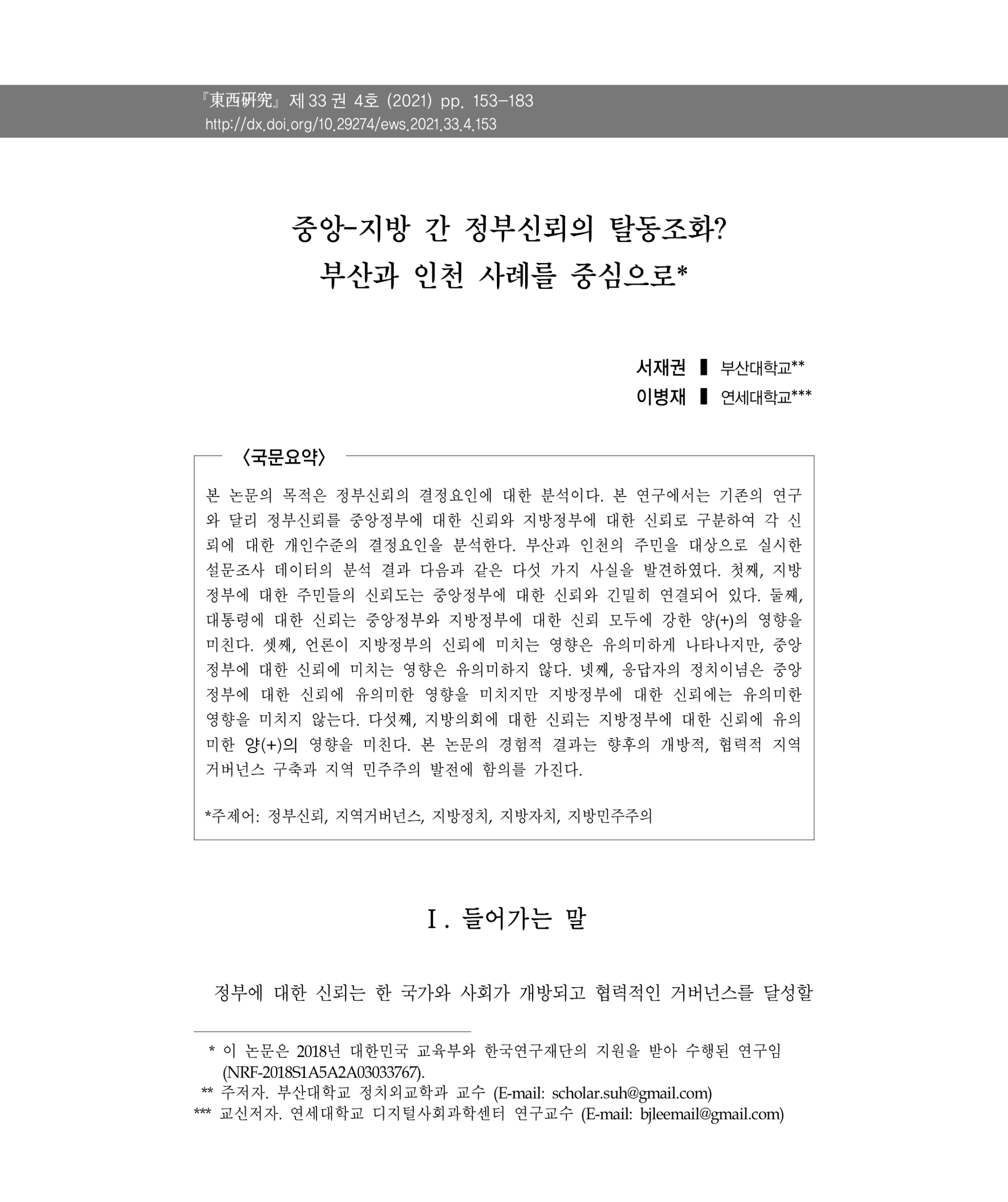
출처: 동서연구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