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아 박사(고려대학교)는 2014년, 2020년, 2025년 등 세 시기의 전국 단위 설문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시민의 민주주의 평가는 사회 갈등 인식 그 자체보다 집권 정당과의 정당 일치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는 유권자들이 갈등을 민주주의 실패로 해석할지 여부를 당파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성과 중심의 민주주의 담론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체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는 갈등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젠더 분쟁 등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상시적인 사회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인식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다.
이 연구는 ‘사회 갈등 인식’과 ‘민주주의 평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정치적 맥락과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교차 분석한 점에서 독창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 집권 정당이 바뀌는 시기를 중심으로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함으로써, 유권자의 민주주의 인식이 고정된 신념 체계가 아닌 정치적 위치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시민일수록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집권 여당 지지자에게서는 사회 갈등 인식과 민주주의 평가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제1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2025년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사회 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더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었다. 이와 유사한 구조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관측된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갈등 인식과 민주주의 평가 간 관계가 약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갈등을 민주주의 실패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제도의 실제 성과나 법치 수준보다는,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가, 즉 정치적 ‘승자’와 ‘패자’의 위치가 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유권자는 사회 갈등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당파적 필터를 작동시키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평가가 정치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이 연구는 갈등이 심화된다고 해서 민주주의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갈등이 있어도, 그것이 ‘내 편’ 정부 하에서 발생한다고 느낄 경우 시민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 반면 같은 갈등이라도 ‘상대 정당’이 집권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이는 민주주의 담론에서 종종 전제되는 ‘제도에 대한 중립적 평가’ 가정을 위협한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법치의 실현이나 선거의 공정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정치적 정체성과 심리적 동일시가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제도 자체의 성과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정당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정치적 승자와 패자 간 민주주의 인식 격차’가 심화될 경우, 민주주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합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입법 및 정책 과정에서도 이러한 유권자 인식의 분화는 주요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어느 정당이 이를 시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제도 개혁의 효과 또한 제한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한국 정치에서 협치의 기반을 복원하고 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상호 인정과 정권 교체의 정당성 수용에 대한 문화적 기반 형성이 필수적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제도의 설계만이 아니라, 시민의 인식 구조와 정치문화 속의 정당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튜브:
https://youtu.be/Rmt_NR9KnsM
정치적 선호가 민주주의 평가를 좌우한다
엄기홍 기자
|
2025.09.09
|
조회 249
갈등 인식보다 중요한 건 ‘누가 집권했는가’라는 점을 실증 분석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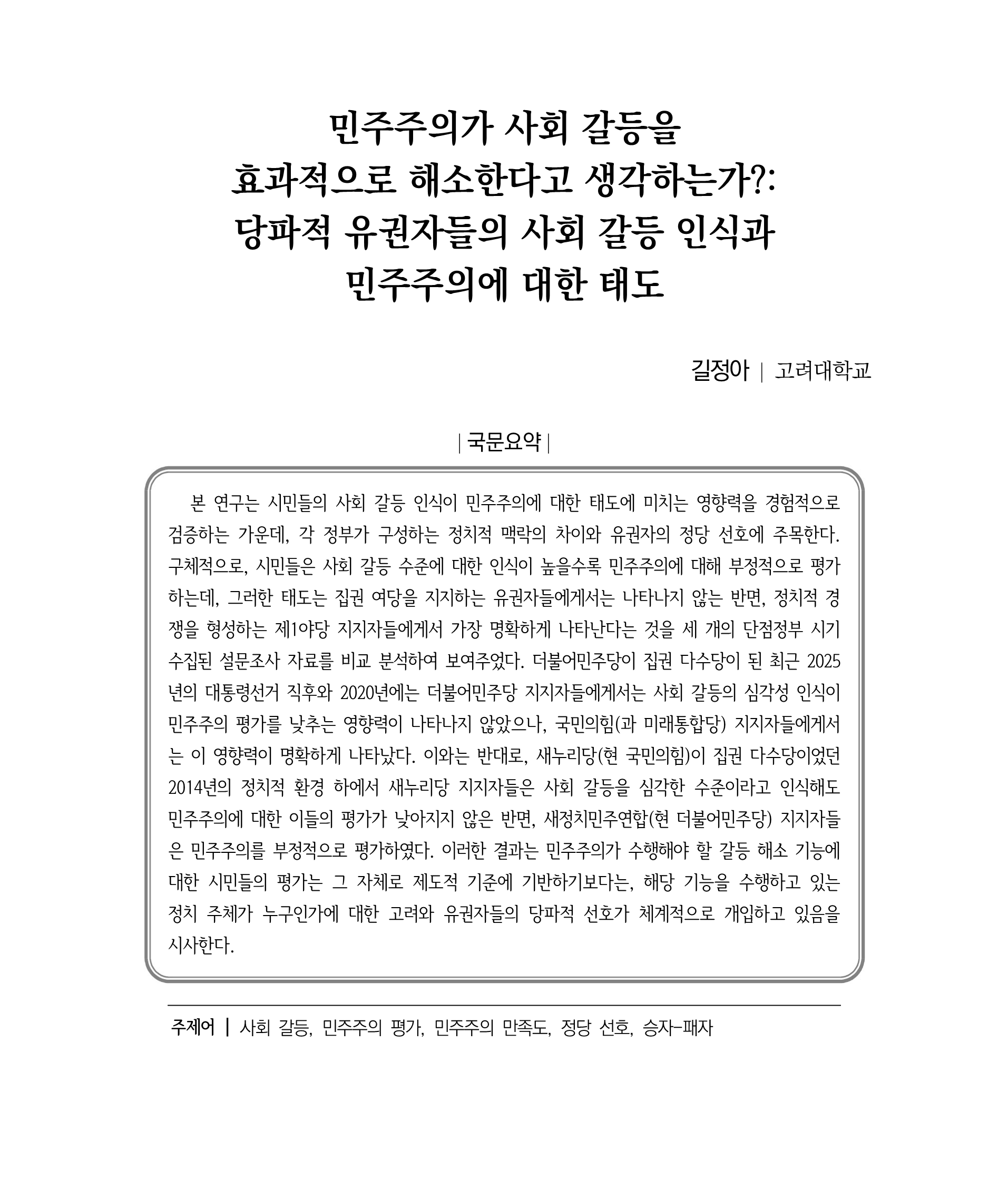
출처: 현대정치연구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