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왜 '군사개입 축소'를 표방하면서도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드론 전쟁을 전개했는가? 육군사관학교 양희용 교수의 연구는 드론의 기술적 속성에 주목하며, 그것이 단순한 수단을 넘어 전략 형성과 정책결정 과정 자체를 재구성했음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연구는 드론 전쟁의 제도화 과정과 국제 규범 질서에 미친 함의까지 폭넓게 조망한다.
21세기 군사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부상한 무장 드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전략적 선택지를 재구성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드론 운용은 군사개입 축소라는 안보 전략과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조건이 결합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연구는 드론이 단지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 자체를 재구성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기존의 전략-구조 속박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드론을 통해 무력 사용의 임계점을 낮추고,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대테러 작전을 정밀하게 수행하는 방식을 제도화했다. 특히 CIA와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가 이원적으로 주도한 드론 프로그램은 ‘징후타격(signature strike)’의 도입, ‘킬 리스트’ 체계화 등을 통해 표적제거의 제도화를 이뤘다. 이는 비공식 전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론이 사용되는 배경이 되었다.
드론 기술의 주요 속성으로는 ▲저비용성 ▲무인 운용성 ▲정밀성과 범용성 ▲실시간 데이터 연결성 등이 꼽히며, 이는 정책결정자들에게 군사적 개입을 보다 쉽게 승인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적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민간인 사망 없이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외과적 정밀성'에 대한 믿음은 국내 정치적 지지 확보에도 기여했다. 실제로 2013년 미국인의 65%는 드론 공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밀성 담론은 비판도 함께 불러일으켰다.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반미 감정을 증폭시키고, 테러조직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드론 작전이 표면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이고 전략적이지만, 실제로는 작전 확대(mission creep), 목표 전환(goal displacement), 정책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기술결정론이 아닌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이 연구는 기술이 정책의 구조를 형성하고 선택지를 제약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드론은 단순히 '무엇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넘어, '무엇을 위협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인식 자체를 구성했다. 이는 기술이 안보 위협 구성과 전략적 선택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코펜하겐 학파의 시각과도 상응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드론 전쟁은 군사기술의 제도화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연구자는 드론이 단지 부시 행정부의 전면전 방식을 대체한 저위험·고정밀의 도구가 아니라, 위험 재평가와 작전 확대, 전략적 사고의 재구성을 촉진한 ‘전쟁 방식의 전환점’이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드론은 무력 사용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변화시키며, 국제 규범 체계와 군비 경쟁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향후 입법과 정책 수준에서 드론 사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율과 공개적 통제 장치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 이외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드론 보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확산과 무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법적 합의가 절실하다. 또한, 기술이 전략적 판단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AI 기반 무기체계로 확장될 안보 정책의 미래를 조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논문: https://doi.org/10.14731/kjir.2025.09.65.3.55
유튜브:
https://youtu.be/kRjR5qP8vr4
오바마 정부의 드론 전쟁, 무기 아닌 전략: 기능주의적 전환의 기점
엄기홍 기자
|
2025.10.13
|
조회 199
정밀성과 효율성 너머, 드론 기술이 정책결정자 전략적 선택에 미친 구조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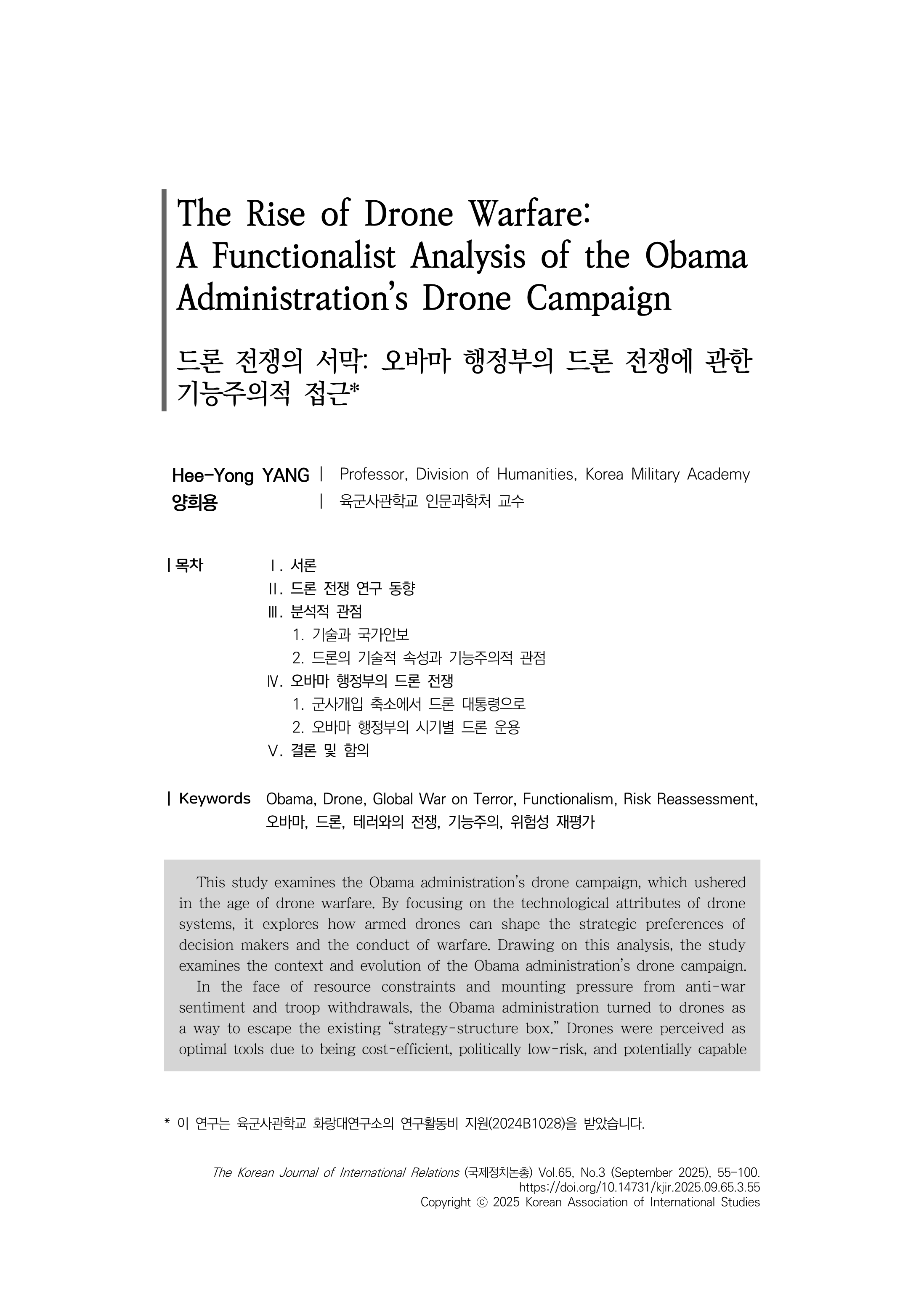
출처: 국제정치논총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