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대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정치 성향 간 북한 인식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담론 수렴’ 현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는 진보·보수 집단 모두에서 북한을 향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북 정책 수립과 정치 협력 구조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념 갈등의 핵심 축으로 작동해 왔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남북 대화 가능성, 통일 필요성 등은 정치 성향에 따라 명확한 분화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북한 담론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재편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인식 변화가 단순한 여론의 표면적 이동이 아닌, 구조적이고 다층적인 변화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분석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수행한 통일의식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전국 성인 남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자료를 결합해, 북한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과 북한에 대한 적대 인식을 중심으로 정치 성향별 변화 추이를 살폈다.
정치 성향은 진보, 중도, 보수로 분류되었고,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응답 경향의 시간적 변화를 정밀하게 추정하였다. 대화 가능성 인식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부터 “매우 가능하다”까지 4점 척도로, 적대 인식은 5점 척도를 재코딩하여 이진 변수로 처리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 기준으로 보수 성향 응답자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진보 성향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보수 성향의 대화 가능성 인식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보수 × 2024: 0.531, p<0.05), 반면 진보 성향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이로써 양 진영 간 인식 간극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다.
둘째, 북한 적대 인식에 있어서는 보수층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에는 진보층의 적대 인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진보 × 2024: 0.514, p<0.05). 보수층의 인식은 소폭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진보와 보수 간 적대 인식 차이 역시 좁혀지는 수렴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국제정치 및 국내 여론 환경의 급변이 있다. 북한의 반복적인 군사 도발, 하노이 회담 결렬, 북러 밀착 등은 대중의 기대를 후퇴시켰고, 남북대화에 대한 피로감과 실용주의적 태도를 강화시켰다. 더불어 2024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대남 기조를 전환한 것도 한국인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는 이러한 수렴 현상이 단기적 여론 이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탈이념화, 정책효과 회의론, 실용주의적 가치 판단이 겹치면서, 이념에 기반한 대북 담론 구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진보와 보수 간 담론 균열이 해소되고, 공통된 정책 인식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 성향 간 북한 인식의 수렴은 단순한 태도의 일치가 아니라, 한국 정치사회 구조의 재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24년을 기점으로 북한 담론이 진영을 초월해 수렴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북 정책의 설계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식 수렴은 초당적 정책 합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대북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실용성과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특히 진보 성향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적대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기존 통일 담론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 따라 향후 통일 및 대북정책은 ‘이념적 당위’가 아닌 ‘정책 효과’와 ‘국민 공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증 자료에 기반한 정책 설계, 대중과의 소통 전략, 안보와 통일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정치적 양극화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담론 환경을 변화시키고, 남북관계 논의의 새로운 지형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논문: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207084
유튜브:
https://youtu.be/3bhqU5JNStc
북한 인식, 진보·보수 모두 바뀌었다
엄기홍 기자
|
2025.10.02
|
조회 187
2024년, 북한 담론이 이념 경계 넘는 '수렴' 시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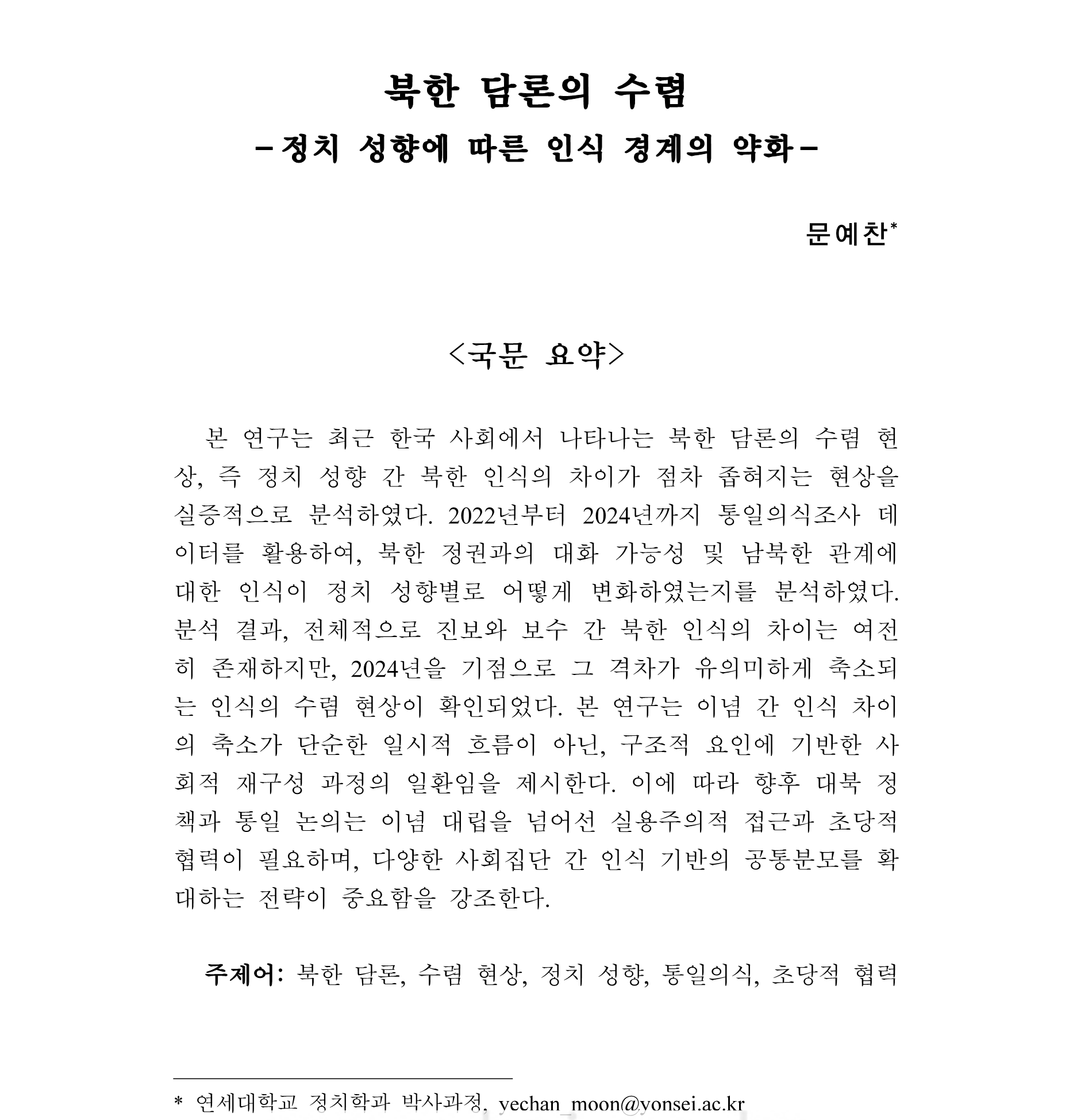
출처: 통일연구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